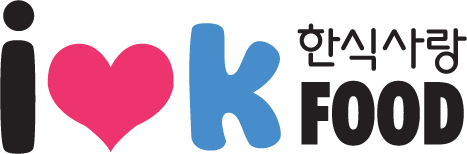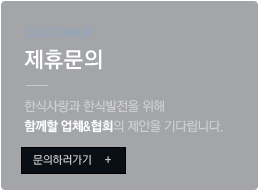나는 매일 잔치를 치르는 기분으로 출근하다
1967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1987년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한강호텔을 거쳐 2002년부터 현재까지 메이필드호텔 한식당 봉래헌에서 10년 가까이 한정식을 책임지고 있다.
- 한식사랑
- 직접입력
- 협회인증
- 협력업체
- API
인사말 & 프로필
조리학과 재학 시절, 나는 닭을 잡는 실습이 고역이었던 얌전한 여학생이었다. 취업을 하던 즈음이 바로 아시안게임이 막 끝난 후였는데, 당시 특급호텔 인사부에서 조리학과 학생들을 스카우트하러 다닐 정도로 외식업은 호황이었다. 그렇게 행운처럼 발을 들인 한 특급호텔의 양식당에서 입사 몇 달 만에 한식으로 전공을 바꿨다. ‘어머니의 손맛’으로 대변되는 한식이 여성 조리사로서 더 적합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정식에 한 획을 그어보리라 다짐을 하고 옮겨간 한식 주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주방에는 손맛 좋은 찬모분들이 여럿 계셨는데 그 분들의 손맛을 이어받는 대신 혹독한 시집살이가 뒤따랐다. 하루 종일 반찬만 옮겨 담느라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힌 기억, 식혜를 담그며 설탕을 빼먹어 밥알이 뜨지 않아 혼났던 기억들은 손맛으로 마디마디 남았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정성스런 마음가짐도 이들에게서 배운 소중한 자산이다.
요즘은 한식 요리사를 자처하는 학생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발을 들였다가도 조금만 고되다 싶으면 바로 떠나는 현실이 아쉽다. 조리 현장을 견뎌낼 각오가 없는 학생들, 출세욕이 앞서는 학생들은 절대로 손맛 전승의 과정을 이겨낼 수 없다. 장인정신이 있어야만 일련의 과정을 즐기며 한식 조리사로서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잔치를 치르는 기분으로 출근한다. 혼자 들른 외국인 손님이 병어조림을 가시만 남긴 채 다 발라 먹고, 전통혼례에 참석했던 단체 손님들이 ‘봉래헌’의 음식으로 편안한 속을 안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나에겐 매일 매일이 잔칫날이다.
프로필&경력
· 1987 롯데호텔,한강호텔 근무
· 2002 메이필드호텔 한식당 봉래헌 근무
· 2002 메이필드호텔 한식당 봉래헌 근무